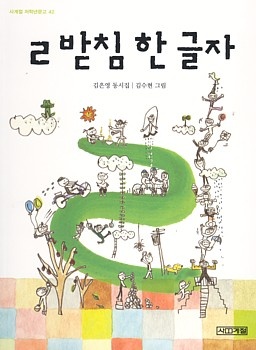(1) 동시 한 자락, 슬픈 얼굴
나날이 ‘어른이 써서 어른하고 나누어 읽는 시’를 마주하기 힘들다 합니다만, 어른시를 쓰는 사람은 제법 있습니다. 예나 이제나 ‘어른이 써서 어린이하고 나누어 읽는 시’는 참으로 드물다 하는데, 참말 어린이시를 쓰는 사람은 몹시 적습니다.
어린이가 즐기는 시는 어른이 쓰기도 하고, 어린이가 스스로 쓰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쓴 시를 문학으로 여겨 처음으로 갈무리하여 선보인 분은 이오덕 님입니다. 《일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은 오로지 어린이시로 이루어집니다.
이오덕 님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는 터전에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거나 느낀 이야기를 고스란히 적도록 도왔습니다. 말을 치레해야 문학이 아니요, 말을 꾸며야 일기가 아니며, 말을 덧발라야 재미나지 않음을 아이들이 깨닫도록 살폈습니다.
문학이란 이야기입니다. 문학이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꿈꾸는 이야기이든, 살아가면서 부대낀 이야기이든, 문학이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야기입니다. 어린이한테는 어린이대로 어린이 눈높이에 따라 바라보거나 마주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날을 어린이로서 어린이답게 글로 담으면 곧 어린이문학입니다.
어른이 써서 어린이하고 나누기에 어린이문학이요, 어린이 스스로 써서 어린이 스스로 즐기기에 어린이문학입니다.
어린이가 읽을 시는 말놀이로 쓸 수 없습니다. 시는 말놀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화이든 소설이든 말놀이가 아닙니다. 말재주를 피운다 해서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말재주는 한낱 말재주입니다.
.. 설 쇠러 가네 / 친척들 만나러 가네 // 어서 가서 / 사촌들 보고 싶은데 // 길이 막혀 / 차들이 설설 기네 // 자동차에 / 날개가 달렸으면 좋겠네 .. (설)
동시책 《ㄹ받침 한 글자》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ㄹ받침으로 끝맺는 외글자 낱말을 글이름으로 삼아 짤막한 시를 잇달아 씁니다. 참 돋보이는 글이로구나 싶으나, 돋보인다뿐, 일부러 재미나게 쓰려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너무도 뻔한 틀에 더없이 얽매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않습니다.
자칫, ‘수수한 여느 삶’을 ‘흔한 삶’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한테 명절날 자가용 타고 ‘시골(고향)’로 가는 일이 수수한 여느 삶이라 해도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삶도 얼마든지 시로 적바림할 만하지요. 시로 잘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ㄹ받침 한 글자》에서 다루는 〈설〉이라는 동시는 얼마나 문학답거나 시다울까 궁금합니다. 꽉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우리 집 자동차만 날개를 달면 무엇이 좋을까요. 왜 이 아이 어버이는 명절날 고속도로가 자가용으로 가득 막히는 줄 알면서 자가용을 끌고 나왔을까요. 시외버스나 기차를 탈 수 없었으려나요. 여느 때 여느 자리에서도 이처럼 자가용을 몰고 이리 다니고 저리 누비고 하겠지요. 요새 웬만한 집에는 다 있다는 자가용이라지만, 우리 집에는 자가용이 없고, 우리 집마냥 자가용 없는 가난한 살림은 어김없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시골을 찾아가는 사람도 많을 터이나, 버스나 기차를 타고 찾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버스나 기차를 타고 시골로 찾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도무지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시골집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문학으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문학하는 이들은 이러한 삶을 겪지도 않고 치르지도 않으니 모를 테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문학을 하지 않으니 ‘수수한 여느 삶’이 문학으로 나오지 않겠지요.
살아가는 자리에서 바라보는 만큼, 살아가는 자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글이 달라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매가 달라지며, 아이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깊이 또한 달라집니다. ‘설설’ 기는 이 한 마디 말놀이 때문에 ‘설’이라는 낱말을 이렇게밖에 다루지 못하는 일은 슬픕니다.
.. 이순신 장군이 / 활시위를 당기네 // →→→→→ / →→→→→ // 적들이 쓰러지네 / 우리나라를 지켰네 .. (활)
시에 문자표를 넣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문자표도 얼마든지 알뜰살뜰 넣을 만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읽히는 위인전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이며, 왜놈이며, 나라사랑이며를 밝힐밖에 없는 제도권 학교 울타리인 터라, 〈활〉이라는 동시는 “우리나라를 지켰네” 같은 실마리 하나로 끝맺는구나 싶습니다.
이 시가 잘못이라거나 어디가 틀린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그저 슬픕니다. 틀에 박힌 생각을 틀에 박힌 짜임새로 선보일 뿐인데, 이러한 시를 시라고, 더욱이 동시라 할 수 있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어린이가 읽는 문학을 어른들께서는 너무 얕게 보거나 가볍게 보거나 섣불리 보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어린이가 읽는 문학에 ‘이 문학을 빚는 어른들 삶과 넋과 꿈과 뜻과 빛과 얼과 살과 피와 뼈’가 고스란히 녹아들도록 애쓰는지 힘쓰는지 용쓰는지 근심스럽습니다.
지난날 이오덕 님이 어린이시를 책으로 묶어 아름다운 문학임을 보여줄 때에도 익히 이야기하셨는데, 어린이문학은 어린이만 보는 문학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모두 보는 문학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 누구나 즐기는 문학이 어린이문학입니다. 어린이시라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는 시입니다. 어린이문학을 다루는 글(평론)은 어른문학을 다루는 글하고 똑같이 써야 하며, ‘문학인가 아닌가’와 ‘문학다운가 문학답지 않은가’를 헤아려야 합니다.
.. 사슴아 / 사슴아 // 뿔이 예쁜 / 꽃사슴아 // 왜 뿔이 없니? / 누가 잘라 갔니? .. (뿔)
이 나라 들판이나 멧자락에는 들사슴이 없습니다. 들여우도 들늑대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가끔 마주하는 사슴들은 사슴우리에서 풀린 녀석들입니다. 한창 사슴고기가 유행처럼 퍼지던 때에 기르다가, 사슴고기 유행이 지나면서 돈벌이가 안 되어 문닫은 우리에서 사슴들이 굶어죽기 싫어 뛰쳐나온 녀석들이 새끼를 치고 퍼지며 조금 돌아다닙니다. 노루도 매한가지입니다. 다, 사람들이 고기며 가죽이며 뿔이며, 이렁저렁 쓰려고 우리에 가두어 키우던 녀석입니다. 가만히 보면 들짐승이 들짐승다이 살아갈 터전이란 한국에는 모조리 사라졌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몸피가 작아 먹이가 조금 적어도 괜찮다 싶은 짐승만 살아남지만, 이마저도 들과 멧자락에서 먹이를 얻기 힘들어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와야 합니다.
문학이란, 이 가운데 시란, 또 어린이시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다룰 때에도 얼마든지 문학이요 시요 어린이시가 되지만, 겉훑기로 그친다면 참말 문학인지 시인지 어린이시인지 알 노릇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과 생각을 살며시 실을 때에 비로소 문학이며 시이며 어린이시입니다. 사슴 머리에 난 뿔을 다루려는 〈뿔〉이라 한다면, 남자 어른들이 사타구니 힘을 기르겠다며 먹는다는 뿔만이 아니라, 사슴들 삶과 이 나라 자연 터전 삶을 함께 아우르면서 생각하여 짧은 글줄에 아름다이 담아내야 합니다. ‘자연보호를 하자. 휴지를 줍자.’ 같은 낡은 독재시대 계몽구호와 같은 글을 적어 놓고, 이러한 글이 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 동시 두 자락, 보듬을 얼굴
동시책 《ㄹ받침 한 글자》를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을 우리 아이한테 읽힐 만한지 가만히 생각합니다. 굳이 이 책에 실린 글을 읽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끼지만, 꼭 세 가지 글은 찬찬히 읽어도 흐뭇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모두 시라 할 만하고도 하는데, 어린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란 둘레 어른한테서 배운 말을 어린이 스스로 짜고 맞추며 엮은 말입니다. 티없이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어린이 말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티있으며 모난 어른들 말을 아이들이 삭이거나 걸러서 길어올린 말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모두 시라기보다, 어른 스스로 얼마나 티없으며 아리땁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린이 말이 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저 군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곧, 어른들 스스로 어른 입에서 터져나오도록 하는 말이 모두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서 시가 되고 어른이라서 시가 안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살아가는 결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이 말이 시가 되지만 엉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나온 사람 입에서 터져나와야 문학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는커녕 중·고등학교 문턱을 못 밟은 사람 입에서 터져나와도, 이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문학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어린이 삶을 잘 헤아리며 좋다 할 만한 시를 쓰지 않습니다. 학교하고는 담 쌓은 여느 아저씨일지라도, 이이 스스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아름다우면서 해맑을 때에는 이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말이 고스란히 시이자 문학이자 어린이시입니다.
글을 몰라 종이에 글을 적바림하지 못하더라도, 살아낸 나날이 아리따운 사람들은 입으로 글을 쓰고 입으로 문학을 합니다.
.. 홀로 사는 옆집 할머니 / “홀몸이니 홀가분해.” 하시지만 /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셔요 // 홀로 사는 옆집 할머니 / “혼자 먹으니 입맛이 없어.” 하시면서 / 나물 반찬 들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셔요 .. (홀)
〈홀〉이라는 동시는 제법 눈여겨볼 만합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 삶을 잘 짚습니다. 다만, 더 살가이 짚지는 못해 아쉽습니다. 이만큼 적바림한 동시로도 고맙습니다만, 이만큼 적바림하며 끝맺을 수는 없는 ‘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나날을 ‘혼자 = 외롭다’로 못박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홀로 살아오기까지 걸어온 길과 홀로 살면서 부대낀 아픔과 홀로 살아내며 일구는 아름다움을 함께 드러낼 때에 비로소 〈홀〉이 마무리됩니다.
.. 나는 딸이야 / 엄마도 딸이었어 / 할머니도 딸이었어 // 나도 커서 / 딸 낳고 싶어 / 딸은 엄마가 되거든 .. (딸)
〈딸〉은 〈아들〉로 바꾸어도 똑같은 글과 글 얼개입니다. 세 딸을 보듬으며 세 여자 삶을 단출한 글월로 품었기에 퍽 좋구나 하고 느끼면서, 막상 ‘세 딸 세 여자’ 삶이란 무엇인지를 마지막 한 줄에서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아기말 ‘엄마’를 털고 ‘어머니’라 말해야 옳습니다만, 요새 사람들은 워낙 말을 말다이 못 쓰니 어쩔 수 없는 대목이고, 이보다 “딸은 엄마가 되거든”이라는 말마디에서는 미처 짚지 못하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밝힐 한 마디를 넣으면 한결 빛날 동시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엄마는 잠결에도 / 아기 숨결 느끼고 // 아기는 꿈결에도 / 엄마 살결 느끼고 .. (결)
잠든 아기 숨결을 느끼는 사람은 어버이입니다. 아이를 낳았대서 모두 어버이가 되지는 않아요. 아이를 낳기 앞서부터 작은 목숨씨를 사랑으로 보듬으며 사랑으로 기다린 끝에 사랑으로 낳아 사랑으로 기르는 이들이 어버이입니다.
어버이는 아이 숨결뿐 아니라 손결과 마음결과 이야기결을 나란히 한몸 한마음이 되어 받아들입니다. 어버이 말결이 아이 말결이 되는 줄 몸으로 알고, 어버이 삶결이 아이 삶결로 이어가는 줄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아이가 먹도록 마련하여 차린 밥자리는 영양소를 아이 몸에 집어넣는 자리가 아니라, 어버이 손결이 담긴 목숨결을 따사로이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동시집 《ㄹ받침 한 글자》를 하나하나 따지면, 썩 괜찮다 여길 만한 동시일지라도 아쉬운 대목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쉽다 할지라도 참으로 ‘수수한 여느 삶자리’를 톺아보면서 나누려는 매무새일 때에는 반갑습니다. 억지스런 말놀이가 아니라 살가운 삶나눔인 동시라는 옷을 입으면 고맙습니다.
머리로 쓰는 시가 아니라 입으로 쓰는 시입니다. 머리로 읽는 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시입니다. 머리로 빚는 말놀이가 아닙니다. 삶으로 일구는 이야기입니다.
― ㄹ받침 한 글자 (김은영 글,김수현 그림,사계절 펴냄,2008.8.5./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