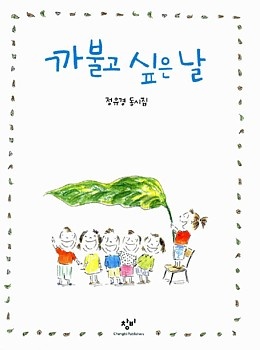넘겨짚기는 동시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겪거나 부대끼거나 살아내지 않고 넘겨짚고서야 동시를 썼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겪어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겪어 보지 않고 책으로 읽거나 남한테서 얘기를 들어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 안 보았고, 내 몸으로 부대끼지 않았으나, 책에 적힌 이야기로 머리에 지식으로 담았으니 안다고 말하는 일은 얼마나 올바를까요. 내 동무나 이웃이나 살붙이 마음을 ‘내 동무나 이웃이나 살붙이한테서 속속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넘겨짚을 때에 나는 얼마나 내 동무나 이웃이나 살붙이 마음을 안다고 할 만할까요.
.. 선생님 질문에 답을 몰라 / 얼굴 빨개졌을 때 / 뒤에서 작은 소리로 / 답을 불러 주었지. // 쉬는 시간에 어떤 애가 / 날 놀리고 달아날 때는 / 그 애 발을 슬쩍 걸어 / 엉덩방아를 찧게 했고. // 왜 그랬을까? / 왜 그랬지? / 아, 궁금해. / 내일 한번 물어볼까? .. (날 좋아하나 봐)
어린이시는 어린이가 손수 쓰기도 하지만 어른이 써서 어린이한테 읽히기도 합니다. 어린이시는 어린이가 읽도록 쓰는 시입니다. 어린이가 읽도록 쓰는 시인 만큼 어린이가 알아듣기 어려운 낱말이나 어린이가 알아챌 수 없는 이야기를 담는다면 어린이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를 읽는다며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느냐?’고 윽박지르듯이 쓰기도 합니다. 어른들 스스로 알아내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이야기를 어른들 스스로 잘 모르는 어려운 말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어린이시나 어른시나 모두 시이면서 문학입니다. 문학이란 말재주나 말놀이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말재주를 부리면 말재주요, 말놀이를 하면 말놀이입니다. 문학은 이 땅에서 고운 목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날이 부대끼면서 이루는 이야기를 글이라는 그릇에 담은 넋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기에 문학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는 꾸밈없이 적바림할 수 있으나, 살을 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는 수수하게 쓸 수 있으며, 맑게 빛나는 무지개처럼 눈부시게 쓸 수 있어요.
수사법이 돋보일 때에 훌륭한 문학이지 않습니다. 수사법을 한 가지도 모르니까 엉터리 문학이지 않습니다. 문학은 수사법이 아니며, 수사법을 잘 쓴다고 문학이 빛나지 않습니다.
.. 난생처음올 파마를 했다. / 내 머리가 뽀글뽀글 / 라면 머리가 됐다. / 엄마랑 누나가 날 보고 / 연예인 같다고 했다. / 히히. / 기분 좋았다. // 미용실 누나가 한 이틀은 / 머리를 감지 말랬는데 / 아차차! / 오늘 아침에 그만 / 감아 버렸다. // 으흑. / 풀린 내 머리 / 불은 라면이 됐다 .. (라면)
어떠한 문학이든 삶을 밑바탕으로 깝니다. 삶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문학이 되지 않습니다. 공상과학문학이든 추리문학이든, 여느 사람들 수수한 삶을 밑바탕으로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꿈으로 헤아리는 누리를 글로 쓴다 하더라도 ‘몸으로 살아가는 누리’를 밑바탕으로 삼아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 누리’를 떠올리지, 지식이나 정보로 아무렇게나 짓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문학을 읽는 사람은 몸으로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는 문학입니다. 삶이 없거나 삶무늬가 없거나 삶결이 없다면, 이러한 작품을 가리켜 문학이라 이름붙일 수 없습니다.
재미있게 읽을 만하도록 쓴다 해서 문학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낱말을 입에서 또르르 굴릴 만하게 썼기 때문에 괜찮은 어린이문학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율을 맞추거나 노래하듯이 쓴다 하기에 어린이시가 되지 않아요.
.. 아! 망했다. / 게임기랑 피자, 치킨 / 다 날아갔다. // 모르는 건 그냥 틀리고 싶은데 / 선생님은 자꾸만 생각을 해 보래. / 그래서 자꾸자꾸 생각을 하니까 / 머리에서 펄펄 김이 나는 것 같아. / 친구들 머리에서도 김이 나겠지? / 선생님 머리에서도 김이 날 거야. / (우리가 못 푸는 걸 보고 열 받아서.) .. (시험)
누구나 살아가는 곳에서 바라보고 부대끼며 이야기를 이룹니다. 이야기는 좋거나 나쁘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냐에 따라 어떤 이야기인가만 있습니다. 살아가는 곳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엮기에, 늘 내 테두리에서 삶·사람·사랑을 봅니다.
훌륭한 삶이나 좋은 사람이나 예쁜 사랑이란 따로 없습니다. 내 삶과 내 사람과 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아이들과 어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착하거나 참답거나 아름다울까요?
아이들이 읽을 동시나 동화를 쓰는 어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동시나 동화를 쓰는 어른인가요?
.. 방금 파마한 머리가 / 마음에 안 들어 / 엄마도 나도 / 시무룩. // 엄마 머리는 금방 풀릴 것 같고 / 내 머리는 너무 뽀글거려 / 거울 속 엄마 얼굴, 내 얼굴이 / 쀼루퉁. // 그랬는데 // 아주머니가 만 원을 깎아 주니 / 엄마 입이 쏙 들어갔다. / 엄마가 예쁜 머리띠를 사 주어서 / 내 입도 쏙 들어갔다 .. (룩*퉁*쏙*쏙)
머리로 쓸 수 없는 시입니다. 입으로 시를 쓴다고도 하는데, ‘입으로 쓰는 시’란 ‘마음으로 쓰는 시’요, 마음으로 쓰는 시란 ‘내가 날마다 일구는 삶으로 쓰는 시’입니다. 내가 선 곳이 흙땅이라면 흙땅 기운과 내음과 소리와 빛깔을 담으면서 쓰는 시입니다. 내가 선 데가 시멘트나 아스팔트라면 시멘트나 아스팔트 기운과 내음과 소리와 빛깔을 실으면서 쓰는 시예요.
흙기운이 배었대서 더 나은 시가 되지 않습니다. 시멘트자국이 난대서 더 못난 시이지 않습니다. 흙기운을 배었으나 어설프거나 어처구니없는 시가 많습니다. 시멘트자국이 덕지덕지 묻었으나 아리땁거나 사랑스러운 시가 있습니다.
동시책 《까불고 싶은 날》에 실린 작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동시책은 글쓴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가를 곱씹습니다.
아이들한테 읽힐 동시를 쓴 초등학교 교사 정유경 님은 아이들이 동시를 읽으며 어떠한 넋 어떠한 꿈 어떠한 삶이기를 헤아리는가 돌아봅니다.
.. 이불 속에서는 / 아이 하나가 / 얼굴을 쏙 내밀고 / 나갈까 말까 / 나갈까 말까 // 가지 눈 틈으로는 / 어린 잎 하나가 / 둘레를 살피며 / 나갈까 말까 / 나갈까 말까 .. (이른 봄날)
〈이른 봄날〉이라는 작품 하나는 어른 삶과 어린이 삶이 살며시 들여다보입니다. 썩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부자리에서 나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 길든 아이들이나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추운 겨울이면 추운 대로 뛰쳐나가고, 더운 여름이면 더운 대로 박차고 나옵니다. 이부자리에서 꼼지락거리는 사람은 도시에서 회사일을 하는 어른들입니다. 시골에서 밭일 논일 하는 어른 또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열어요.
.. 하늘에 / 해와 달과 별은 / 매일매일 / 내 머리 위에 나타나 // 내가 사는 곳이 / 우주라는 걸 / 살짝살짝 / 알려 주지요. // 내가 볼 때도 / 안 볼 때도 .. (해와 달과 별)
동시책 《까불고 싶은 날》 책날개를 보면, 글쓴이는 “춘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적힙니다. 출판사에서 이처럼 적었는지 글쓴이 스스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는 노릇인데,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나는 선생님이에요.”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낱말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높이고자 ‘-님’을 붙이는 부름말이지, 스스로 ‘선생님’이라 말하거나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자리에서 ‘선생님’이라 할 수 없어요.
동시이든 어린이시이든 어른시이든 문학이든 모두 말을 다룹니다. 말 한 마디를 갈고닦기도 하지만, 말 한 마디에 꿈과 넋과 사랑과 믿음을 싣기도 합니다. 말 한 마디에 따스한 손길과 너그러운 마음밭을 담습니다. 말마디마다 고운 이야기씨가 깃들고, 말마디에는 너른 이야기숲이 우거집니다.
“내 머리가 뽀글뽀글 / 라면 머리가 됐다. / 엄마랑 누나가 날 보고 / 연예인 같다고 했다. / 히히. / 기분 좋았다.”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틀림없이 있을 테고, 이런 생각을 글로 담아 동시를 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 왜 그랬지? / 아, 궁금해. / 내일 한번 물어볼까?” 하고 헤아리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어디에서 누구하고 나누려 하는가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이어주려 하는가요. 이 나라 아이들은 앞으로 서로서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이 살아가는 길을 일구면 좋다고 생각하는가요.
말놀이 아닌 말사랑으로 어른인 내 삶을 먼저 차분히 되새기고, 말재주 아닌 말나눔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하루를 가만히 톺아보면서, 착한 마을과 흙빛 손길을 보듬는 글밭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동시가 될 수 없지만, 잔솜씨를 부려도 어린이시는 되지 않습니다.
― 까불고 싶은 날 (정유경 씀,창비 펴냄,2010.8.20./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