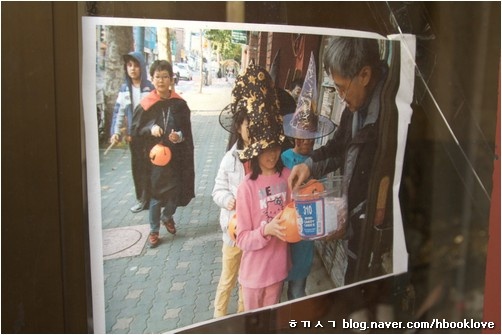시골집에서 옆지기랑 아이하고 살아가면서 도시마실을 차츰 줄입니다. 처음 시골집으로 옮길 때에는 마무리지을 일거리가 제법 있어 여러모로 마음쓰느라 시골에서 주마다 인천이나 서울을 들락거렸는데, 주마다 들락거리니 몸도 마음도 몹시 지칩니다. 두어 주에 한 번 마실하기로 바꾸니 조금 수월하지만 그닥 낫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마실하는 흐름이 되니 꽤 괜찮지만 도시에서 머무는 동안 마셔야 하는 물과 바람은 내 몸에 그닥 안 좋다는 느낌이 짙습니다. 아무것 안 하면서 가만히 서더라도 숨을 기쁘게 들이쉬기 어렵습니다.
한국땅에서 어느 시골이 물과 바람이 깨끗하다 할 만하느냐 따질 수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티벳이나 네팔이나 쿠바나 칠레를 헤아려 보셔요. 한국땅 시골은 시골이라 하기 힘들 만큼 지저분하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몽골에서처럼 밤하늘 가득 채우는 별을 볼 수 없는 한국땅 시골이잖아요.
그러나 몽골이든 핀란드이든 덴마크이든 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터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땅 시골이 다른 나라 시골하고는 댈 수 없도록 썩 깨끗하지 못할 뿐더러 들짐승이나 멧짐승 또한 씨가 마른다 하지만, 시골은 시골입니다. 등불 하나 없이 고요한 시골은 그야말로 고요한 시골입니다. 뜸뿍새나 꾀꼬리 찾아보기 힘든 시골자락이라 하더라도 올빼미나 뻐꾸기나 딱따구리가 어떻게든 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맹꽁이 보기 어렵다지만 개구리는 농약 안 치는 시골에서는 어렵잖이 만납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새 도룡뇽조차 아주 드문 목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잖아 도룡뇽은 천연기념물이 될 테며, 도룡뇽을 없애는 고속철도 공사를 놓고 우리 뒷사람들은 ‘몇 분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자며 몇 조에 이르는 돈을 퍼붓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터를 아끼거나 사랑하는 일이었느냐며 나무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월 한 달, 시골집에서 참으로 조용하면서 호젓하게 지내던 30일, 서울 혜화동 헌책방 〈혜성서점〉 사장님한테서 전화 한 통 걸려옵니다. 헌책방 〈혜성서점〉 사장님은, “4월 5일에 책방 문을 닫게 됐어. 한 번 올라올 수 있나. 저녁이나 같이 먹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3월 30일 밤, 이른아침부터 신나게 놀던 아이를 재우고 아버지도 겨우 고단히 잠자리에 눕는데 손전화로 쪽지가 옵니다. 서울 노고산동에 자리헌 헌책방 〈숨어있는 책〉 아저씨네 어머님이 저녁 무렵에 돌아가셨다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마실을 하려고 도시로 마실을 나온다면 퍽 기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시로 마실을 나가려고 시외버스를 타고 한두 시간을 달리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시외버스에 올라타고 십 분쯤 지날 때부터 머리가 핑핑 돌며 뱃속이 마구 울렁거려요. 한손으로 이마를 짚고 다른 한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면서 몸을 달랩니다. 시외버스를 내리고 나서는 숱한 사람물결에 휩쓸리거나 치이거나 밟히면서 넋이 나갑니다.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어수선한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책방에 닿으면 겨우 한숨을 돌리지만, 책방마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면 다시금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렇지만, 책방마실이 아닌 헌책방 두 곳에 일이 생겼습니다. 반가운 이야기가 아닌 궂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반가운 이야기라면 한달음에 달려가겠지요. 서로서로 기뻐하며 웃고 떠들겠지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반가운 일이 있을 때에는 애써 찾아가지 않으며 손전화로 인사를 할 수 있겠다고. 이처럼 궂긴 일이 있을 때에는 시골에 고즈넉히 묻혀 지낼 때가 훨씬 조촐하며 즐겁고 홀가분하지만,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치더라도 도시에서 아파하는 책벗 마음밭과 어깨동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들게 힘들게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몰고 나와 읍내 버스역에 가니, 타야 하는 버스가 한 차례 쉬고 4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날궂이를 하는구나 생각하며 이웃 면으로 가서 시외버스를 탑니다. 열두 시 사십 분 즈음 길을 나섰더니 낮 세 시 십 분 즈음 서울에 떨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시간쯤 달려 강남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자리한 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찾아갑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합니다. 다시 자전거를 달리다가 전철을 타고 충무로역에 내립니다. 사진관에서 흑백필름 열 통을 사고는 종로를 지나 혜화동으로 달립니다. 서울 시내에는 자동차가 억수로 많다고 새삼스레 느낍니다. 이토록 많디많은 자동차들은 모두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뻗었는데, 애써 자가용을 몰아 움직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택시도 많은데 짐을 가득 실어 날라야 하지 않을 때에도 굳이 자가용을 몰아야 할까 궁금합니다.
헌책방 〈혜성서점〉에 닿습니다. 등판이 땀으로 절었습니다. 책방을 코앞에 두고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책방에 닿아 사장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은 웃는 얼굴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저 웃습니다. 나는 〈혜성서점〉 사장님 웃음이 쓴웃음이라거나 슬픈 웃음이라거나 아쉬운 웃음이라거나 느끼지 않습니다. 〈혜성서점〉을 처음 만난 열 해쯤 앞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장님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든, 장사가 잘 안 되든,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책이 들어왔든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책방을 통째로 다른 곳에 넘기기로 하셨답니다. 오늘 낮에 한쪽 책꽂이를 조금 덜어 짐차를 불러 실어 갔다고 합니다. 텅 빈 자리를 바라봅니다. 조금 일찍 왔다면 아직 책이 꽂혔을 때 모습을 마지막으로 찍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다가는, 이렇게 쓸쓸하게 빈 모습하고 아직 가득 쌓이거나 꽂힌 모습을 나란히 바라보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일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 손님인지 지나던 길손인지 한 분이 책방 골마루를 죽 둘러봅니다. 그러나 아무 책도 끄집어 내지 않습니다. 다른 책방에 통째로 넘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볼 만한 책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1978∼79년부터 헌책방을 차렸다는 〈혜성서점〉 마지막 책손 모습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마지막 책손이 사진 찍히기를 싫어하는 말을 꺼내려 한다면 “아주머님이 이곳 마지막 손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즐겁게 찍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책손인 아주머님은 사진에 찍히면서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절을 꾸벅 합니다.
1960년대 첫머리부터 샛장수를 하며 때때로 길장사를 하기도 했다는 〈혜성서점〉 전인순 사장님은 1978∼79년에는 이 자리 맞은편에서 꽤 작은 가게로 간판 없이 헌책방을 꾸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리다가 서로 따로 가게를 차리기로 하며 이곳에 1985년부터 가게를 꾸렸다고 하니까, 한 자리 스물여섯 해이고, 헌책방 살림으로는 서른두어 해입니다. 서른두어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이 이곳을 거쳐 새로 빛을 보았을까요.
그동안 책손으로만 드나들다가 책방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한참 사진을 찍다가 필름을 가는데, 그만 필름을 다 안 감았는데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 어, 어. 빙글, 눈물 한 방울. 이제 더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뭐지, 다 감은 줄 알고 뚜껑을 열었는데 다 안 감았잖아.
화들짝 놀라 뚜껑을 얼른 닫지만, 한 번 연 뚜껑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앞서 감긴 필름은 몇 장이나마 살았으려나요. 어떤 사진이 살았으려나요. 숨을 꼬옥 참으며 1/8초나 1/15초로 찍은 온갖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처음으로 책방 돌바닥에 드러누워 보꾹을 올려다보는 사진을 몇 장 찍어 봅니다. 보꾹을 찍은 사진도 하릴없이 날아갔으려나요.
사진을 한참 찍고 나니 비로소 책시렁 책 몇 가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책도 굳이 끄집어 내지 않습니다. 꽂힌 채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래도 차마 어루만지지 않을 수 없기에 두어 권은 살며시 뽑아 봅니다. 살며시 뽑고는 가슴으로 살살 어루만진 다음 고개 한 번 숙이고 제자리에 꽂습니다. 제자리에 꽂은 책은 책등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들겨 반듯하게 갈무리합니다. 반듯하게 꽂는다 한들 이제 두 번 다시 아무 책손도 이리로 와서 책 구경을 할 일은 없을 텐데. 흐트러짐이 거의 없이 늘 반듯하게 꽂히거나 묶인 책으로 가득한 〈혜성서점〉이었음을 누구 하나 떠올릴 수 있으려나.
〈혜성서점〉 사장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합니다.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와 사진기를 목에 걸고 바라봅니다. 사장님이 쇠가림문을 주루룩 내리는 모습을 필름으로 다섯 장 찍습니다. 새 필름을 갈아넣었는데, 잘 나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참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느 때에는 잘 안 나오면 다음에 다시 와서 새로 잘 찍으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살짝 흔들리든 못 찍든 놓치든 하면 그예 끝입니다.
6000원짜리 해장국을 한 그릇 얻어먹습니다. 매운 먹을거리를 못 먹지만 보리술을 곁들여 맛나게 먹습니다. 〈혜성서점〉 사장님은 문득 얘기합니다. “한 권 한 권 이 책을 모으려고 해 봐. 돈이 얼마가 드나. 한꺼번에 가져간다면 싸게 치이겠지만.”
끝내 사랑받지 못한 책들이 통째로 다른 책방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 사랑받지 못한 책은 다른 책방으로 넘어갔을 때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얌전히 꽂힌 책들은 이곳이었기에 사랑받지 못했으려나요, 이 책들이 사랑받을 만한 책이 못 되었을까요, 아직 이 책들이 사랑받기에는 때가 일렀을까요.
나는 우리 옆지기 말 한 마디를 늘 잊지 못합니다. 우리 옆지기가 둘째를 배기 앞서, 또 첫째를 배기 앞서, 가벼운 몸일 때에 함께 헌책방마실을 하노라면 으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있으면 이 책방을 통째로 사고 싶어요.”
어느 헌책방이든 아무 책이나 막 갖추지 않습니다. 어느 헌책방이든 모든 책시렁 책을 하나하나 살피고 고르며 손질해서 사들인 다음 갖춥니다. 어느 헌책방이든 싸구려라 하든 비싸구려라 하든 책방 일꾼 스스로 값을 치러 장만한 책을 갖춥니다.
나는 나대로 나한테 쓸모있을 책을 골라서 사겠지요. 옆지기는 옆지기대로 다른 책손은 다른 책손대로 제 입맛과 눈맛과 마음맛에 맞을 책을 가려서 살 테지요.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옆지기 말만큼 옳은 말이 없습니다. 버릴 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마다 다 달리 아름다이 빛나는 책 가운데 어느 하나 뺄 책이란 없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이야기와 느낌으로 빛나는데, 어느 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담은 책이든, 눈속임이나 겉치레나 허울을 담은 책이든,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떤 눈썰미와 매무새로 읽느냐에 따라 참말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얄궂거나 구지레한 이야기만 가득한 책이더라도 ‘이 책은 이토록 슬프게 만들었구나’ 하고도 느낄 만하지만, ‘나한테는 구지레하거나 부질없어 보일는지 모르나 이 글을 쓴 사람으로서는 살가우며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리라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헌책방 이야기 또한 적잖은 사람한테는 덧없거나 부질없거나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헌책방하고 이웃한 자리에는 커피집이 있습니다. 손수 굽는 빵을 함께 파는 이 커피집 역사는 짧습니다. 이 커피집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며 동네사람한테서 사랑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헌책방 옆 커피집이요, 커피집 옆 헌책방으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는 나날을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즐거우며 아름다웠을 텐데 하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으로 끝입니다.
헌책방이 빠진 자리에는 떡볶이집이 들어온다는데, 떡볶이집하고 이웃 커피집은 잘 어울릴 수 있겠지요.
몸 한쪽이 많이 아파 복지카드를 가지신 〈혜성서점〉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는 41로 엽니다. 그런데 당신은 1938년에 나셨으나 출생신고가 세 해 늦어 1941년이 되었다는군요. 그래, 일흔네 살입니다. 1960년대 첫무렵에 샛장수부터 책을 만지셨으면 스물을 갓 넘긴 때부터 헌책을 만지셨고, 쉰 해 가까이 헌책하고 살아온 나날입니다.
어느 회사이든 공직이든 ‘마흔 해 근속’이란 거의 없습니다. ‘서른 해 근속’만 되더라도 대단하다 합니다. 그런데, 헌책방 일꾼을 찬찬히 살피면 ‘서른 해 헌책살림’을 한 사람을 놓고는 ‘젊은이’라 일컫습니다. 적어도 마흔 해는 넘어야 ‘어엿한 어른’이라 일컫고, 쉰 해나 예순 해를 잇는 헌책방 일꾼이 꽤 있어요.
빵집 가운데 마흔 해나 쉰 해를 넘긴 곳이 더러 있으리라 봅니다. 이 가운데 마흔 해나 쉰 해 남짓 빵을 한결같이 굽는 분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찻집이나 옷집 가운데 혼자서 마흔 해나 쉰 해 남짓 가게살림 잇는 분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누구보다 오래오래 정치를 한다지만, 마흔 해나 쉰 해 남짓 정치를 하는 분은 몇이나 될까요. 심부름꾼 없이 홀로 제길을 걸어가며 살림을 꾸리는 분은 얼마나 되려나요.
헌책방 일꾼은 서른 해나 마흔 해나 쉰 해나 예순 해에 걸쳐 책을 만지지만, 막상 헌책방 일꾼한테 ‘책이야기 한 꼭지 써 주셔요’라 바라거나 ‘책이야기 꼭지에 앞으로 100회나 500회쯤 글을 써 주셔요’라 바라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쇠가림문이 철커덩 내려오는 소리를 떠올립니다. 쇠가림문을 내리기 앞서 짐자전거를 가게로 들이는 모습을 되새깁니다. 이제 사장님이 짐자전거를 몰 일이 있으려나요. 댁은 강서구 등촌동이라는데, 짐자전거는 어찌 될까요. 바깥에 내놓은 책이 햇볕에 바래지 않도록 몇 해 앞서 50만 원을 들여 붙인 해가리개는 어떻게 되려나요. 오랜 나날 이곳하고 한몸이 되었던 가게 간판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식구 모두한테 아름다운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두 손에 굳은살 박히며 책먼지 흠씬 뒤집어쓰면서까지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나 사랑스러움과 평화로움을 곱게 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혜성서점〉에서 책 한 권 장만했던 분이든 〈혜성서점〉 이름 넉 자 모르던 분이든, 우리 곁에 포근하게 자리잡던 헌책방 한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책마을 살림살이 아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