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다시 만난 지하철 역사 할머니들
밤새 잠을 못자고 뒤척였다.
거실 창밖으로 뿌연 하늘이 안녕~굿모닝하고 인사를 한다.
안녕... 그런데 나 굿모닝 아냐.
요며칠 바짝 신경쓸 일이 생겨서 가뜩이나 모자란 잠이 거의 잠을 못자다보니 머리가 띵하다. 요즘 치매가 10대 질병인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되었고 치매의 주요 원인은 수면 부족이라던데...
머리가 아파서 침대 머리에 잠깐 기댄 것이 잠으로 이어졌나보다. 알람소리에 번쩍 깨어 심계옥엄니 새벽 목욕시키려고 나오다 넘어졌다. 선잠에 갑자기 일어나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서서 나오다 뭔가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 머리를 티비 장식대 모서리에 부딪쳤다. 그 순간 귀 언저리가 너무 아파 한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넘어지면서도 뒤로 넘어가지 말고 옆으로 넘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뒤로 자빠지면 뇌진탕에 걸려 그 자리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나는 뒤로 넘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옆으로 넘어졌다. 귀 밑머리 어디쯤인가에 진한 아픔이 느껴졌고 반사적으로 나는 손을 귀에 얼른 갖다 댔다가 뗐다.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부터 먼저 확인 했다. 소리가 들린다. 다행이다. 다음엔 귀 밑머리를 손바닥으로 훓어 내렸다. 그리고 손바닥을 쫙 펴서 피가 묻었는지 확인했다. 피도 나지 않는다. 또 다행이다. 그런데 일어서야지 하는데 일어서지지가 않는다.
119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몇 가지 검사를 받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거 아시죠? 며칠 입원하셔서 검사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응급과장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병원문을 나섰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반짝반짝 해가 맑고 환하다. 그런데 내 몸은 으슬 으슬 춥고 바들바들 떨린다. 추운건 몸이고 서글픈건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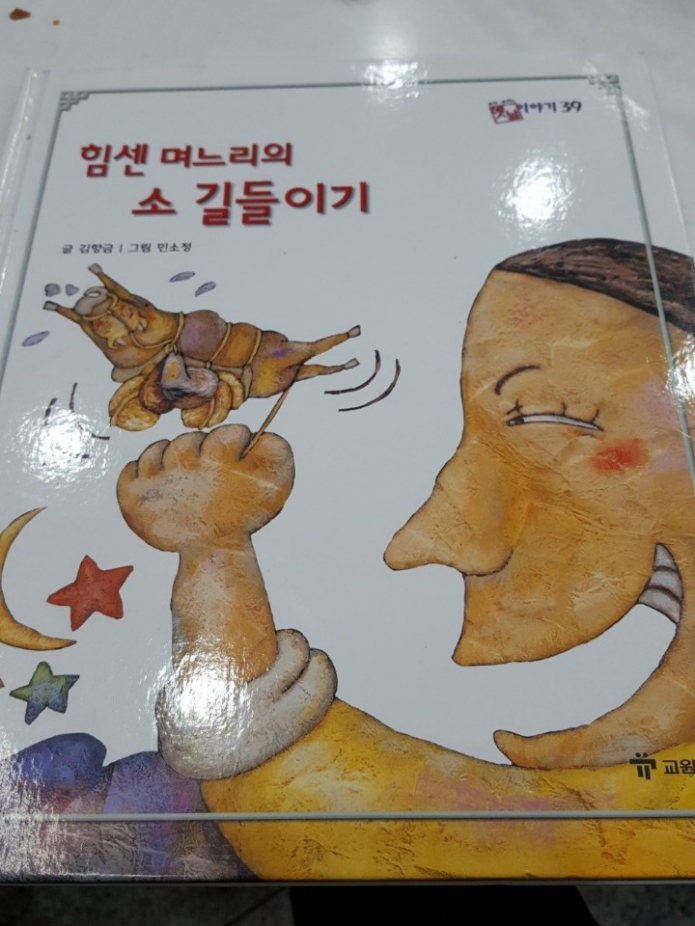
지하철 역사 한 편에 만들어 놓은 휴게공간 세 면의 벽엔 설렁설렁 책이 꽂혀 있는 책꽂이가 서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살펴보니 옛이야기 전집인건 분명한데 다른 책들은 죄 어디 가고 이 빠진 것처럼 그림책들 서너 권 이 여기저기 제 멋대로 꽂혀있다. 아는 책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 보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그림책들을 읽고 싶었다. 내 마음에 드는 책들이 없는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사 휴게공간에 책들이 있다는게 반가웠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지하철역사안에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게 반갑고 고맙다.
집에서 기다리시는 심계옥엄니가 마음에 걸려 마음 급하게 책들을 휘휘 넘겨가며 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나는 책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진싸 속셈은 지난번에 이 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 2시에 와서 이야기들을 나누시다 5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할머니들. 시계를 보니 세시 반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으신다. 책꽂이에서 그림책 한 권을 뺐다. 할머니들이 오면 읽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힘쎈 며느리의 소 길들이기>
나도 이 그림책 속 며느리처럼 힘이 쎄지고 튼튼해지고 싶다.
"이게 누구야, 지난번에 우리들헌테 애덜 책 읽어줬던 그 이쁜 선상님 아냐?"
어느새 오셨을까? 할머니 세 분이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서계셨다.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한 분을 꼬옥 안아드렸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다. 할머니들이 나하고 만나자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나는 할머니들이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난 것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주책이다 진짜.
"그런데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고 있어?"
폐지를 주워서 손주들 과자 값을 버신다는 81세 할머니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다. 식빵 한 통이랑 작은 보온병. 폐지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오셨다. 따라도 따라도 자꾸자꾸 나오는 모락모락 연기나는 조금한 보온병.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만큼 따뜻하다.
"오늘은 이 빵뿐이야."
폐지 줍는 할머니가 쉼터에 오시는 할머니들 간식을 늘 챙겨오시나보다.
"할머니?"
"응, 왜?"
탈탈탈 보온병을 털어 보리차를 쪽 따르시던 페지 할머니가 선한 웃음으로 나를 보며 웃으신다.
"할머니가 매일 매일 우리 할머니들 드실 빵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에요?"
"사오긴. 사오는 거 아냐. 박스 주서다가 갖다주믄 회사에서 빵을 나눠 줘. 딴 날은 곰보빵도 주고 팥빵도 주고 이거저거 갖가지로 주더니만 오늘은 요 식빵밖에 안주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안 줘도 그만이지. 노인네들 먹으라고 빵까지 내주니까 고맙지.덕분에 우리 할메들이랑 요렇게 낭거 먹을 수도 있고 고맙지."
마음 착한 할머니는 일회용장갑까지 챙겨오셨다.그러자 옆에 앉으신 예쁜 모자를 쓰신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쓱쓱 걷어부치고 일회용 장갑을 양손에 끼신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식빵을 먹기좋게 조금씩 쭉쭉 찢어 공평하게 나누신다. 종이컵에 따라 먹는 따끈한 보리차 한 잔과 폭신 폭신한 식빵. 아, 맛나다.
지하철 역사안 쉼터에 오후 2시면 모이셔서 이얘기 저얘기 이야기 꽃 피우시다가 정확히 오후 5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들 가시는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헤어지기 십 삼분 전에 오셔서 할머니들에게 입 궁금하지 말라고 허기 면하라고 고물상에서 주신 빵을 나눠 잡숫는 폐지줍는 할머니. 우리집에 종이박스가 있던가? 버릴 책들이 남아있나? 없나? 폐지줍는 할머니에게 드릴 폐지가 있는지 순간 내 머리속이 바쁘다.
"할머니, 사시는 댁이 어디세요?"
"우리집? 저~~어기"
할머니댁이 어디냐 여쭈니 저어기라고 입술로 가리키시는 할머니.
" 우리집은 왜 물어?"
"할머니께 저희집에 있는 헌책이랑 신문지 박스랑 모아서 갖다 드리려구요."
"에구, 안 그래도 돼. 맘도 착하기도 해라. 선상님 집이 요기서 가깝나?"
"아니요. 좀 가야돼요. "
"에그 근데 뭘 갖다준데. 마음 만으로도 고마와.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씩 하믄 돼. 걱정허지 말어.
할머니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무거운 책이랑 박스를 챙겨서 가져다 드리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폐지를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다가 팔아야겠다. 폐지 값이 많이 싸져서 얼마가 될 진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지하철 역사에 계신 할머니들 드실 무우 시루떡이랑 두유랑 사야겠다. 그게 낫겠다.
역시 내 병의 좋은 치료약은 우리 할머니들이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반짝 반짝 햇님이 곱고 다정스럽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