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박물관 인문학강의, '인천 문학예술의 지형과 특징'

“그동안 인천은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거나 꼴찌에서 두 번째다. 누가 되든 관심이 없는 데다 누가 나와도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천의 정체성이 ‘철새도래지’나 ‘대합실’이기 때문이다.” 4월 30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문학강좌에서 <인천 문학예술의 지형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다. 다음은 모두 강연을 한 김윤식 시인의 말이다.
“인천이 역사상 기록된 건 B.C. 18세기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문학산에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물이 짜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망했다. 이처럼 인천의 첫 역사 시작은 이주해온 이주민이다. ‘철새도래지’나 ‘대합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곧 떠날 준비를 하는 곳이다. ‘철새도래지’는 제비가 봄에 와서 집도 짓고 부화시켜 나는 연습을 하고, 가을이면 날아간다. 새들은 갈 때까지 주어진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
“1883년 인천은 개항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김구 선생이 개항장재판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김구 선생 어머니가 옥바라지하던 때는 약 20여 호가 살던 작은 항이었다. 하지만 인천 문이 열리면서 인천에는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다. 일자리가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200명이던 인구가 1만명~3만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으로 몰려든 사람들 대부분이 패가망신을 당했다. 인천을 ‘피 빨아먹는 악마도굴’이라 부르기도 했다. 전국에서 원성이 높아졌다. 거기다 ‘짠물’이라는 수식어도 생겼다. 1907년 한국 최초로 천일염을 만들었다. 뻘이 많고 조수간만 차가 커서 가능했다.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낙섬도 있었다. 인천에서 소금을 많이 만드니까 ‘짠물’이라고 불리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들어 넉넉지 않게 살다보니 뭐가 부족해도 옆집에서도 빌리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각박해졌을 것이다.”
“평양냉면은 인천 향토 음식이다. 육수, 수육 한 덩어리, 계란, 고명을 넣는다. 인천에는 삽시에 사람이 몰려들었고, 더욱이 인천항 쪽에 많이 몰렸다. 제물포에서 ‘포’가 있다고 해서 포구 아니었나, 매립돼서 이러나 하는 사람이 있다. 문인협회 회원도 그렇게 시를 쓰더라. 우물과 개울을 구별해야 한다. 누군가 친절하게 인천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서울로 간 친구들은 오랜만에 인천에 오면 “인천 많이 변했다. 우리 우동 먹었던 데가 어디냐. 없어졌으면 짜장면 먹자”고 한다. 고향 자체가 그 사람 자체에 녹아들어야 하는데, 인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에는 냉면 이야기를 하자. 1920년대 인천에는 냉면집이 3개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다. 나중에는 기차로 배달했다. 인천은 면의 고장이다. 냉면, 쫄면, 짜장면이 다 원조다. 인천에는 두세 집 건너 냉면집이 있었다. 경동사거리 경인식당 육수 맛은 달랐다. 장대에 종이술을 달고 자전거 타고 배달 곡예를 벌이기도 했다. 냉면은 술 먹은 다음날이나 겨울에 육수를 두 컵 정도 먹고 냉면 먹으면 배가 뿌듯해서 나오게 된다. 옛날맛이 그대로 살아 있다. 냉면을 먹는 순서는 입-젓가락-그릇에 1/3씩 걸려 있다.”
“인천문학 밥상은 보잘 것 없다. 인천을 떠난 사람도 집어넣어야 풍족하다. ‘인천 문학예술의 지형과 특징’은 대부분 인천을 떠나고 없다는 것이다. 인천의 문인들은 경우에 따라 2~3군데 터전을 가지고 있다. 작고한 화가 상당수도 인천 출신이다. 그들은 이후에 인천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인천은 서구문물이 많다. 곧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한국 최초의 경인철도 기공지도 도원역이다. 인천도 알고 보면 예쁘고 정이 많이 가는 도시다. 철새는 내일 지 고향으로 날아가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이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온 것 자체가 인천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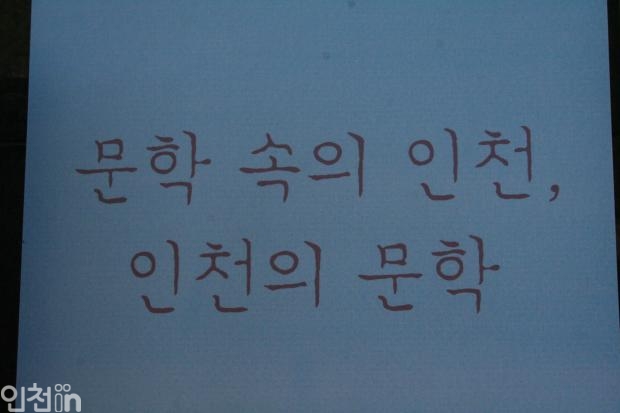
“인천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근거없이 타지에 가서 살려면 누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자연히 삶이 각박해지고 나름 타개책을 생각했을 것이다. ‘생활이면사’에 남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건 애석하다.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반성해야 한다. 인천에는 ‘미두친인소’가 생겨 일확천금을 꿈꾸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그러다 보니 잘 자리, 먹을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인천에 여관이 많이 생기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생겨났다.”
“백석 시에 보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이야기가 나온다. 메밀국수 이야기도 몇 군데 나온다. 인천에서는 냉면에 쇠고기를 넣었다. 개항하면서 사람이 국제항이 되었다. 군함, 여객선들이 들어오니까 날마다 소를 잡아야 했다. 지금 동구청 자리에 큰 도살장이 생겼다. 스테이크용 좋은 부위는 쓰고 나머지는 버렸다. 이때 소뼈다귀 해장국이 생겼다. 냉면은 가을에 메밀을 수확하고, 긴긴 겨울밤 출출할 때 동치미국물에 말아 먹었다. 인천에서만 쇠고기국물에 쇠고기 한 점을 얹어서 먹었다. 쇠고기 한 점, 계란 반 알이라고 규격화해서 많이 팔았다. 송월동 일대에는 ‘얼음공장’이 많았다. 일본 사람들이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보관용 얼음이 많이 필요했다.”
“추탕(추어탕)도 인기가 좋았다. 통미꾸라지에 나물 잔뜩, 두부, 곤자손(창자 끝 기름), 쇠고기, 내장을 넣었다. 내가 커서 추탕을 먹을 만하니까 없어졌다. 유감이다. 인천은 냉면, 해장국, 추탕을 만든 본산지다.”
“‘신발’도 만들어내었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서양풍, 일본인 근대풍의 들어왔다. 우리는 미투리, 짚세기뿐이었다. 발바닥 편한 값싼 신발이 필요했다. 쩍쩍 갈라진 조선 사람들의 발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1895년 아펜 젤러가 커피도 마셨을 것이다. 대불호텔에 머무르면서 그는 “잠자리는 춥고 불편했지만 음식은 입맛에 맞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용동 큰우물’은 어렸을 때 먹었다. 그 옆에 노가리집은 맛있었다. 냄새가 사람을 기절시켰다. 1918년 안기영이 채소가게를 했다. 일본 친구가 풀이 죽어서 찾아왔다. 일본 고베항, 서울에 와서 신발 세일했다. “조선서는 영 안 먹힌다”고 말했다. 안기영의 아이디어로 고무신을 불티나게 팔았다. 인천사람은 창의적이다. 외지에서 온 샤람들도 창의력이 생길 것이다."

“신포동 카페베네 자리에는 인천 최초의 상설시장이 있었다. 이곳에 사는 일본인들이 생선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3, 5일장이었는데 여기는 인구가 적어 장이 서지 않았다. 제물포쪽 사람들이 사는 게 열악했다. 정치국이 낸 생선가게를 보고는 일본 사람들도 감탄했다. ‘생선 대가리 자르고 가시 발라내는 게 누부셨다’고 한 기록도 있다.
인천 근현대사 130년가량 인천땅에 와서는 눈부신 창의력이 발휘됐다. 하지만 인천에서 돈을 모으면 사람들은 철새가 되어 서울로 간다. 그게 참 묘하다. 제물포고 지형이 ‘삼태기형’이다. 인재들이 모였다 흩어져 서울로 갔다.”
“인천 문학도 이런 풍토와 기후에서 나온다. ‘들어왔다 떠난다. 하지만 텅 빈 듯하지만 슬며서 와서 다시 찬다.’ 인천에 왔으면 동화하고 녹아들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접착제’처럼 녹여 붙일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 인천은 푸대접을 다 받으면서 서울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같은 인천 풍토처럼 문학도 예술도 닮았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