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신산한 나날들. 비라도 펑펑 왔으면 함께 엉엉 울기라도 했을 텐데. 다른 곳에 많이도 왔다는 비는 그림자도 못 보았다. 집과 사진관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느라 아침 저녁 눈물 대신 땀이 흐른다. 뭐 이리 마음이 엉기는지. 안개 속에 헤매이는 듯 나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철수씨 판화가 삽화로 들어있는 옛날 책 <몽실언니>가 새로 나왔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보기만 했던 그 책을 주문했다. 그리고 느낌표였던가에서 추천했던 <곽재구의 포구기행>을 썼던 그가 시인이라는 걸 처음 알고 그의 <와온바다>라는 시집 한 권도 샀다.

<몽실언니>는 읽다가 속상해서 덮었다. 어려서부터 타인들의 삶이 아프고 슬픈 게 싫어서 소설을 읽는 게 싫었고 아직도 그 뻔한 내러티브가 힘들다. 대부분 진실을 대면하는 것만 가지고는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분노했고, 싸웠고, 그리고 나서야 그 고통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런 진실, 현실의 반복에 지치고 힘들어졌다. '일상속, 생활속 실천'을 나름의 화두로 살고 있지만 그 '일상'은 참으로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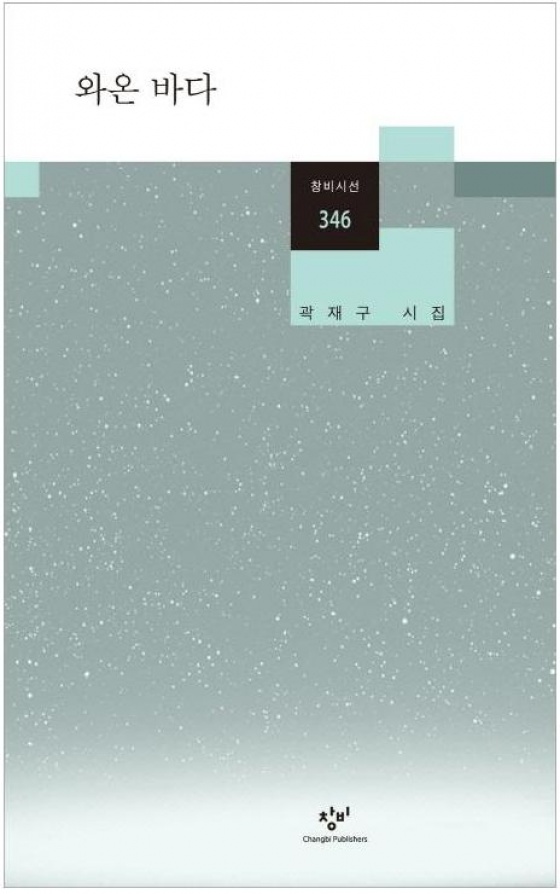
<와온바다>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5월19일 방송에서< 토요일에 만난 사람들> 코너에 나와 시인이 읽어준 시들이 좋아서 샀다.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가슴에 울려 13년 만에 냈다는 그 시집이다. 그런데 그는 관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에겐 너무 먼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 아직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가끔'을 빼면 허락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내게도 그런 시간이 올 텐가?
손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지 않으니 자유로와진 느낌이 들었는데, 한 달째 가슴은 자꾸 무거워지고, 마음은 자꾸 허공을 헤매고 있다. 카메라에 내 마음을 맡긴 채 살았던 것일까? 그 카메라마저 무심해졌을 때 나는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無心한 일상속에서조차 신용카드와 공과금 영수증은 날아들고, 비민주적인 진보, 친북종북이니 이데올로기 등의 언어 속에 6.10항쟁과 피흘리는 이한열의 사진이 다시 신문에 실렸다. 전두환이라는 자가 육사를 사열했다는 짧은 기사가 구토나게 만든다. 노동하는 아빠를 '가난한 아빠'라고 교육하는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읽혀진다는 소리에 속이 부글거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적을 비관한 학생의 죽음이 오늘 아침도 내 눈을 적신다. 이렇게 눈물이 흐를 때마다 나는 화가 난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히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 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 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